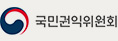[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36년, 64년 그리고 80년 전, 뜨거웠던 8월들" (데일리안, 2025.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6회 작성일 25-08-08 09:49본문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36년, 64년 그리고 80년 전, 뜨거웠던 8월들" (데일리안, 2025.08.08)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33247/
<사진> “여행의 자유” 구호를 들고 행진하는 동독 주민들. ⓒ 사진제공 dpa-Bildarchiv
<사진> ‘범유럽 소풍’ 홍보 포스터. ⓒ 사진제공 Attila Kisbenedek(AFP)
<사진> ‘범유럽 소풍’에서 봇물 터지듯 오스트리아로 진입하는 동독 주민들. ⓒ 사진제공 Tamas Lobenwein/Archive of the Pan-European Picnic Foundation
64년 전 1961년, 8월의 열기가 처참히 식었다. 13일 베를린장벽이 섰다. 동서 냉전, 동서독 간 대립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왕래가 그나마 가능했던 베를린, 동서로 완전히 분리됐다.
자유에의 열망은 꺼지지 않았다. 불과 며칠 만에 희생자가 났다.
8월 22일, 이다 지이크만(Ida Siekmann)이 장벽에 맞닿은 자기 집에서 서베를린 쪽으로 뛰어내리다 중상을 입고 사망했다. 59세가 되는 다음날 자유를 만끽하고자 했었다.
24일에는 24세 귄터 리트핀(Günter Litfin)이 장벽을 뛰어넘다 총알 세례를 받았다. 최초의 사살 희생자였다.
마지막 총격 사망자는 1989년 2월 5일 크리스 귀프로이(Chris Gueffroy), 당시 20세였다. 3월 8일에는 풍선기구를 만들어 타고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던 32세 빈프리드 프로이덴베르크(Winfried Freudenberg)가 추락해 숨졌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까지 최소 136명, 최대 445명이 숨졌다. 7만 1000여 명이 투옥되었다.
동서독 1393㎞ 전 접경선도 마찬가지였다. 동독은 물샐틈없는 요새를 만들었다.
목적은 단 하나, 주민의 탈출 방지. 인민이 주인이라는 독일민주공화국(동독)에서 인민의 자유는 철저히 유린당하였다.
동독 주민은 꺾이지 않았다. 빼앗긴 자유를 스스로 쟁취하고자 했다(“모가지를 비틀어도 꺾을 수 없는 자유로의 의지”, 2025.02.05.).
자유·민주주의·인권·복지 등 모든 면에서 훨씬 앞서고, 자신들을 독일 국민이자 서독 국민으로 인정하는 서독에 희망을 품었다.
1985년 등장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과 ‘글라스노스트(개방)’ 정책도 큰 힘이 되었다.
기폭제는 1989년 5월 7일 동독이 자행한 선거 부정이었다. 체감 현실과 다르게 나타난 조작된 선거 결과에 주민들이 거리에 나섰다.
자유선거, 비밀선거, 체제 개혁과 개방, 특히 ‘여행의 자유’가 시위의 중심 구호였다.
결정적 돌파구는 뜻밖에도 동독의 사회주의 형제국이자 군사동맹(1955년의 바르샤바 조약 기구: WTO, 1991년 해체)인 헝가리에 의해 만들어졌다.
36년 전, 1989년 8월 19일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 합작해 개최한 ‘범유럽 소풍(Pan-European Picnic)’, 세계사적 변곡점이었다.
사실 헝가리의 대담한 거 사는 이미 그해 5월 2일 새벽에 시작되었다.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철조망을 잘랐다. 냉전의 상징 ‘철의 장막(Iron Curtain)’에 구멍을 뚫은 것이다.
아무런 팡파르 없이 감행했던 국경 개방, 헝가리의 제안과 오스트리아의 화답으로 두 외무장관이 6월 27일 재현해 세상에 알려졌다.
서방 언론, 특히 서독 라디오·TV로 이를 접한 동독 주민의 판단과 결단은 신속했다. 탈출구 헝가리로 휴가 계획을 짰다. 부다페스트 서독대사관에 진입해 서독행을 요구했다.
8월 베를린도 달아올랐다. 8일 동베를린 소재 서독 상주대표부에 동독 주민이 들이닥쳤다. 131명이나 뛰어들어 서독행을 요구했다.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었던 서독은 대표부의 문을 닫았다.
경제난에 직면해, 정치·경제적 개혁과 서방과의 관계 개선으로 확고하게 방향을 잡은 헝가리는 더 극적인 ‘의거’를 계획했다. 구멍이 아니라 아예 철의 장막을 걷어버리고자 했다.
고르바초프가 내세운, 소련이 맹주로 군림했던 동유럽국가에 각자의 내정(內政)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한다는 원칙, 이른바 ‘시나트라 독트린(Sinatra Doctrine: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정치적 사고’를 프랭크 시나트라의 곡 ‘My Way’에 비유한 표현)’을 본격 시험하고자 했다. 국운(國運)을 건 대모험이었다.
적대적 군사동맹체인 NATO 회원국 어느 나라와도 국경을 접하지 않는 헝가리가 중립국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해도, ‘시나트라 독트린’을 선언한 고르바초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으리라는 계산도 했다.
‘범유럽 소풍’을 오스트리아와 함께 기획했다. 고르바초프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공감하도록 평화 행사로 포장했다. 공식 상징도 철조망을 뚫고 나오는 비둘기로 정했다. 장소는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지 쇼프론(Sopron)이었다.
헝가리는 이 행사를 자유와 민주화를 염원하는 동유럽국가 시민들의 자리로 만들어, 동유럽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에 헝가리의 개혁 의지를 알리려 했다.
홍보는 주로 서방 언론을 통했고, 민간단체를 활용해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휴가를 가장한 동독 주민들이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돌아 집결하기 시작했다.
8월 19일, 벌떡이는 심장으로 숨죽인 동독 주민, 문이 열리자마자 600~700명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철의 장막을 벗어났다. 베를린장벽 구축 이래 최대 규모의 대량 탈출이었다.
고르바초프는 개입하지 않았다. 소식이 전해지자 동독 주민의 헝가리행 ‘엑소더스(Exodus)’가 시작했다. 성공에 자신을 얻은 헝가리는 마침내 9월 10일 국경을 전면 개방했다.
체코슬로바키아도 새로운 자유 행 탈출로가 되었다. 프라하의 서독대사관도 동독 주민으로 넘쳤다.
한 달 안에 십만 명 이상의 동독 주민이 서독, 자유의 땅을 밟을 수 있었다.
1961년 얼어붙었던 8월의 열기, 1989년 8월 더 큰 화력으로 불이 붙어 11월 9일 베를린장벽을 녹아내리게 했다.
역시 인민이 주인이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주민의 자유, 스스로 쟁취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인권·복지 모든 면에서 앞서고,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공인하는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희망이다.
동독에의 헝가리가 북한에 중국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중국이 어떻게든 북한에, 북한 주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400㎞ 국경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을 배제하는 한, 통일은 힘들다.
80년 전 8월 15일, 환희와 감격으로 눈물의 ‘만세’를 목 놓아 외쳤다.
분단 80년을 맞는 뜨거운 8월, 분단 해소·통일 구상은커녕 장벽이 남쪽 내부에 열기를 뿜으며 솟아오르고 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33247/
<사진> “여행의 자유” 구호를 들고 행진하는 동독 주민들. ⓒ 사진제공 dpa-Bildarchiv
<사진> ‘범유럽 소풍’ 홍보 포스터. ⓒ 사진제공 Attila Kisbenedek(AFP)
<사진> ‘범유럽 소풍’에서 봇물 터지듯 오스트리아로 진입하는 동독 주민들. ⓒ 사진제공 Tamas Lobenwein/Archive of the Pan-European Picnic Foundation
64년 전 1961년, 8월의 열기가 처참히 식었다. 13일 베를린장벽이 섰다. 동서 냉전, 동서독 간 대립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왕래가 그나마 가능했던 베를린, 동서로 완전히 분리됐다.
자유에의 열망은 꺼지지 않았다. 불과 며칠 만에 희생자가 났다.
8월 22일, 이다 지이크만(Ida Siekmann)이 장벽에 맞닿은 자기 집에서 서베를린 쪽으로 뛰어내리다 중상을 입고 사망했다. 59세가 되는 다음날 자유를 만끽하고자 했었다.
24일에는 24세 귄터 리트핀(Günter Litfin)이 장벽을 뛰어넘다 총알 세례를 받았다. 최초의 사살 희생자였다.
마지막 총격 사망자는 1989년 2월 5일 크리스 귀프로이(Chris Gueffroy), 당시 20세였다. 3월 8일에는 풍선기구를 만들어 타고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던 32세 빈프리드 프로이덴베르크(Winfried Freudenberg)가 추락해 숨졌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까지 최소 136명, 최대 445명이 숨졌다. 7만 1000여 명이 투옥되었다.
동서독 1393㎞ 전 접경선도 마찬가지였다. 동독은 물샐틈없는 요새를 만들었다.
목적은 단 하나, 주민의 탈출 방지. 인민이 주인이라는 독일민주공화국(동독)에서 인민의 자유는 철저히 유린당하였다.
동독 주민은 꺾이지 않았다. 빼앗긴 자유를 스스로 쟁취하고자 했다(“모가지를 비틀어도 꺾을 수 없는 자유로의 의지”, 2025.02.05.).
자유·민주주의·인권·복지 등 모든 면에서 훨씬 앞서고, 자신들을 독일 국민이자 서독 국민으로 인정하는 서독에 희망을 품었다.
1985년 등장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과 ‘글라스노스트(개방)’ 정책도 큰 힘이 되었다.
기폭제는 1989년 5월 7일 동독이 자행한 선거 부정이었다. 체감 현실과 다르게 나타난 조작된 선거 결과에 주민들이 거리에 나섰다.
자유선거, 비밀선거, 체제 개혁과 개방, 특히 ‘여행의 자유’가 시위의 중심 구호였다.
결정적 돌파구는 뜻밖에도 동독의 사회주의 형제국이자 군사동맹(1955년의 바르샤바 조약 기구: WTO, 1991년 해체)인 헝가리에 의해 만들어졌다.
36년 전, 1989년 8월 19일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 합작해 개최한 ‘범유럽 소풍(Pan-European Picnic)’, 세계사적 변곡점이었다.
사실 헝가리의 대담한 거 사는 이미 그해 5월 2일 새벽에 시작되었다.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철조망을 잘랐다. 냉전의 상징 ‘철의 장막(Iron Curtain)’에 구멍을 뚫은 것이다.
아무런 팡파르 없이 감행했던 국경 개방, 헝가리의 제안과 오스트리아의 화답으로 두 외무장관이 6월 27일 재현해 세상에 알려졌다.
서방 언론, 특히 서독 라디오·TV로 이를 접한 동독 주민의 판단과 결단은 신속했다. 탈출구 헝가리로 휴가 계획을 짰다. 부다페스트 서독대사관에 진입해 서독행을 요구했다.
8월 베를린도 달아올랐다. 8일 동베를린 소재 서독 상주대표부에 동독 주민이 들이닥쳤다. 131명이나 뛰어들어 서독행을 요구했다.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었던 서독은 대표부의 문을 닫았다.
경제난에 직면해, 정치·경제적 개혁과 서방과의 관계 개선으로 확고하게 방향을 잡은 헝가리는 더 극적인 ‘의거’를 계획했다. 구멍이 아니라 아예 철의 장막을 걷어버리고자 했다.
고르바초프가 내세운, 소련이 맹주로 군림했던 동유럽국가에 각자의 내정(內政)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한다는 원칙, 이른바 ‘시나트라 독트린(Sinatra Doctrine: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정치적 사고’를 프랭크 시나트라의 곡 ‘My Way’에 비유한 표현)’을 본격 시험하고자 했다. 국운(國運)을 건 대모험이었다.
적대적 군사동맹체인 NATO 회원국 어느 나라와도 국경을 접하지 않는 헝가리가 중립국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해도, ‘시나트라 독트린’을 선언한 고르바초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으리라는 계산도 했다.
‘범유럽 소풍’을 오스트리아와 함께 기획했다. 고르바초프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공감하도록 평화 행사로 포장했다. 공식 상징도 철조망을 뚫고 나오는 비둘기로 정했다. 장소는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지 쇼프론(Sopron)이었다.
헝가리는 이 행사를 자유와 민주화를 염원하는 동유럽국가 시민들의 자리로 만들어, 동유럽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에 헝가리의 개혁 의지를 알리려 했다.
홍보는 주로 서방 언론을 통했고, 민간단체를 활용해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휴가를 가장한 동독 주민들이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돌아 집결하기 시작했다.
8월 19일, 벌떡이는 심장으로 숨죽인 동독 주민, 문이 열리자마자 600~700명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철의 장막을 벗어났다. 베를린장벽 구축 이래 최대 규모의 대량 탈출이었다.
고르바초프는 개입하지 않았다. 소식이 전해지자 동독 주민의 헝가리행 ‘엑소더스(Exodus)’가 시작했다. 성공에 자신을 얻은 헝가리는 마침내 9월 10일 국경을 전면 개방했다.
체코슬로바키아도 새로운 자유 행 탈출로가 되었다. 프라하의 서독대사관도 동독 주민으로 넘쳤다.
한 달 안에 십만 명 이상의 동독 주민이 서독, 자유의 땅을 밟을 수 있었다.
1961년 얼어붙었던 8월의 열기, 1989년 8월 더 큰 화력으로 불이 붙어 11월 9일 베를린장벽을 녹아내리게 했다.
역시 인민이 주인이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주민의 자유, 스스로 쟁취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인권·복지 모든 면에서 앞서고,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공인하는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희망이다.
동독에의 헝가리가 북한에 중국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중국이 어떻게든 북한에, 북한 주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400㎞ 국경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을 배제하는 한, 통일은 힘들다.
80년 전 8월 15일, 환희와 감격으로 눈물의 ‘만세’를 목 놓아 외쳤다.
분단 80년을 맞는 뜨거운 8월, 분단 해소·통일 구상은커녕 장벽이 남쪽 내부에 열기를 뿜으며 솟아오르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