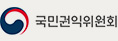[베를린에서 백두산으로 - 35] "환희의 프리드란트 합창" (매경프리미엄, 2022.02.28)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20회 작성일 22-03-30 12:05본문
[베를린에서 백두산으로 - 35] "환희의 프리드란트 합창" (매경프리미엄, 2022.02.28)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2/02/31563/
그뤼네스 반트가 된 1393㎞ 동서독 접경선을 종주하다 잠시 길을 벗어나 그뤼네스 반트는 아니지만 의미가 큰 접경 마을 프리드란트(Friedland)를 방문한다. '접경통과수용소(Grenzdurchgangslager)'가 있었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우리 '하나원'의 원형인 셈이다. 자유를 찾아 남한에 도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적응교육을 마치고 지역사회로 편입된다.
프리드란트는 교통 요지다. 서독에 속했던 니더작센과 헤센주(각각 영국군과 미군이 점령), 그리고 소련 점령지였던 튀링겐주가 만나는 3각 접경지다. 니더작센에 속하는 괴팅겐시의 작은 마을로 인구는 1만3000여 명(2020년 말 기준)이다. 괴팅겐과 동독 베브라를 연결하는 철도 통과지기도 하다.
1945년 9월 20일 당시 영국 점령군은 프리드란트에 전쟁귀환병, 탈출자, 추방자를 위한 임시수용시설을 만들었다. 괴팅겐대학교 농업실습장 용지를 이용하였다. 초기에는 군(軍) 막사용 원형의 양철건물을 사용하다가 목조건물을 거쳐 지금의 콘크리트건물로 바뀌었다.
<사진>
▲ 반원형 양철수용소를 보존하여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 사진=손기웅
독일 중앙에 위치하는 교통 요충지라는 점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는 수만 명의 전쟁귀환병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몸을 달랬다. 1946년부터 시작된 전쟁 포로 귀환은 1955년 콘라트 아데나워 수상이 소련을 방문한 후 마지막 1만여 명이 프리드란트로 향했다. 이들이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수용소 내 교회에서는 '프리드란트 합창(Choral von Friedland)'으로 불리는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Nun danket alle Gott)"라는 찬송가가 울려 퍼졌다.
<사진>
▲ 소련에 포로로 붙잡혔다 풀려난 전쟁귀환병 1진이 1946년 10월 프리드란트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을 맞는 베레모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이곳은 영국군 점령지였다. / 사진=프리드란트박물관
동서 분단이 굳어지자 수용소는 동독으로부터의 탈출자와 이주자, 전쟁 이전 동구 사회주의국가에 거주했던 독일인들 가운데 추방된 자들을 임시로 수용하는 시설로 활용되었다. 나치가 만든 집단수용소(Konzentrationslager)가 죽음의 굴이었다면, 프리드란트 접경통과수용소는 생명, 자유, 희망의 둥지였다.
지금은 동구권으로부터 오는 이주자 2~3세대들의 임시 거주소로 사용되고 있다. 수용소에는 침상이 700개 이상 있고, 1945년 이후 400만명 이상이 이곳을 거쳤다.
<사진>
▲ 1950년 프리드란트 접경통과수용소의 일상 / 사진=프리드란트박물관
한편 1948년부터 1956년까지 수용소는 동부 및 동남부 유럽과 서독 간의 전쟁 기간에 헤어진 부모와 자녀들이 만나는 상봉장소로 활용되었다. 철의 장막이라는 첨예한 냉전의 한가운데에서도 적십자와 교회의 인도적 노력으로 수많은 가족 재통합이 이루어졌다.
<사진>
▲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해 적은 애타는 호소는 우리와 다를 바 없다. / 사진=picture-alliance/dpa, KBS 이산가족 찾기
공산화된 베트남을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바다로 탈출했다. 이른바 '보트 피플(Boat People)'이다. 서독은 베트남 난민 3만5000명을 받아들였고, 그중 4500명이 이곳에 수용되었다.
프리드란트 임시수용소는 2011년 1월 1일부터 니더작센주 망명 신청자를 위한 구호소 겸 임시숙소로 이용되고 있다. 2013년에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초기 난민 5000명이 이곳을 찾았다.
서독과 통일독일의 인도주의에 입각한 개방적 난민정책은 나치의 죄악에 대한 반성과 자유민주국가 건설 다짐의 표현이다.
<사진>
▲ 1978년 12월 3일 프리드란트 수용소에 도착한 베트남 보트 피플, 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에서 자유를 본다. / 사진=프리드란트박물관
<사진>
▲ 접경통과수용소 배치도로 병원, 카리타스(Caritas), 여성센터, 교육실, 어린이집, 놀이방, 세탁실, 청소년실과 숙소 등이 구비되었다. / 사진=손기웅
<사진>
▲ 접경통과수용소 현재의 모습 / 사진=손기웅·강동완
<사진>
▲ 접경통과수용소 내 교회 앞에는 자유의 몸이 되어 이곳에 도착한 전쟁귀환자들을 추념하고 자유를 되새기는 동상이 서 있다. 그들이 왔을 때 환영의 종이 찬송가와 함께 울려 퍼졌다. / 사진=손기웅
프리드란트 접경통과수용소를 떠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북한이탈주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시 네 자리 숫자였던 입국 탈북민 수는 두 자리로 급감했다. 북한 상황이 좋아져서일까, 김정은의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어서일까. 아니면 북한 인권과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소홀해지고, 온 탈북민도 포승줄로 묶어 다시 북으로 돌려보낸 문재인정부 행태가 북한 사회에 널리 알려진 탓일까.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2/02/31563/
그뤼네스 반트가 된 1393㎞ 동서독 접경선을 종주하다 잠시 길을 벗어나 그뤼네스 반트는 아니지만 의미가 큰 접경 마을 프리드란트(Friedland)를 방문한다. '접경통과수용소(Grenzdurchgangslager)'가 있었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우리 '하나원'의 원형인 셈이다. 자유를 찾아 남한에 도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적응교육을 마치고 지역사회로 편입된다.
프리드란트는 교통 요지다. 서독에 속했던 니더작센과 헤센주(각각 영국군과 미군이 점령), 그리고 소련 점령지였던 튀링겐주가 만나는 3각 접경지다. 니더작센에 속하는 괴팅겐시의 작은 마을로 인구는 1만3000여 명(2020년 말 기준)이다. 괴팅겐과 동독 베브라를 연결하는 철도 통과지기도 하다.
1945년 9월 20일 당시 영국 점령군은 프리드란트에 전쟁귀환병, 탈출자, 추방자를 위한 임시수용시설을 만들었다. 괴팅겐대학교 농업실습장 용지를 이용하였다. 초기에는 군(軍) 막사용 원형의 양철건물을 사용하다가 목조건물을 거쳐 지금의 콘크리트건물로 바뀌었다.
<사진>
▲ 반원형 양철수용소를 보존하여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 사진=손기웅
독일 중앙에 위치하는 교통 요충지라는 점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는 수만 명의 전쟁귀환병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몸을 달랬다. 1946년부터 시작된 전쟁 포로 귀환은 1955년 콘라트 아데나워 수상이 소련을 방문한 후 마지막 1만여 명이 프리드란트로 향했다. 이들이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수용소 내 교회에서는 '프리드란트 합창(Choral von Friedland)'으로 불리는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Nun danket alle Gott)"라는 찬송가가 울려 퍼졌다.
<사진>
▲ 소련에 포로로 붙잡혔다 풀려난 전쟁귀환병 1진이 1946년 10월 프리드란트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을 맞는 베레모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이곳은 영국군 점령지였다. / 사진=프리드란트박물관
동서 분단이 굳어지자 수용소는 동독으로부터의 탈출자와 이주자, 전쟁 이전 동구 사회주의국가에 거주했던 독일인들 가운데 추방된 자들을 임시로 수용하는 시설로 활용되었다. 나치가 만든 집단수용소(Konzentrationslager)가 죽음의 굴이었다면, 프리드란트 접경통과수용소는 생명, 자유, 희망의 둥지였다.
지금은 동구권으로부터 오는 이주자 2~3세대들의 임시 거주소로 사용되고 있다. 수용소에는 침상이 700개 이상 있고, 1945년 이후 400만명 이상이 이곳을 거쳤다.
<사진>
▲ 1950년 프리드란트 접경통과수용소의 일상 / 사진=프리드란트박물관
한편 1948년부터 1956년까지 수용소는 동부 및 동남부 유럽과 서독 간의 전쟁 기간에 헤어진 부모와 자녀들이 만나는 상봉장소로 활용되었다. 철의 장막이라는 첨예한 냉전의 한가운데에서도 적십자와 교회의 인도적 노력으로 수많은 가족 재통합이 이루어졌다.
<사진>
▲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해 적은 애타는 호소는 우리와 다를 바 없다. / 사진=picture-alliance/dpa, KBS 이산가족 찾기
공산화된 베트남을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바다로 탈출했다. 이른바 '보트 피플(Boat People)'이다. 서독은 베트남 난민 3만5000명을 받아들였고, 그중 4500명이 이곳에 수용되었다.
프리드란트 임시수용소는 2011년 1월 1일부터 니더작센주 망명 신청자를 위한 구호소 겸 임시숙소로 이용되고 있다. 2013년에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초기 난민 5000명이 이곳을 찾았다.
서독과 통일독일의 인도주의에 입각한 개방적 난민정책은 나치의 죄악에 대한 반성과 자유민주국가 건설 다짐의 표현이다.
<사진>
▲ 1978년 12월 3일 프리드란트 수용소에 도착한 베트남 보트 피플, 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에서 자유를 본다. / 사진=프리드란트박물관
<사진>
▲ 접경통과수용소 배치도로 병원, 카리타스(Caritas), 여성센터, 교육실, 어린이집, 놀이방, 세탁실, 청소년실과 숙소 등이 구비되었다. / 사진=손기웅
<사진>
▲ 접경통과수용소 현재의 모습 / 사진=손기웅·강동완
<사진>
▲ 접경통과수용소 내 교회 앞에는 자유의 몸이 되어 이곳에 도착한 전쟁귀환자들을 추념하고 자유를 되새기는 동상이 서 있다. 그들이 왔을 때 환영의 종이 찬송가와 함께 울려 퍼졌다. / 사진=손기웅
프리드란트 접경통과수용소를 떠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북한이탈주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시 네 자리 숫자였던 입국 탈북민 수는 두 자리로 급감했다. 북한 상황이 좋아져서일까, 김정은의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어서일까. 아니면 북한 인권과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소홀해지고, 온 탈북민도 포승줄로 묶어 다시 북으로 돌려보낸 문재인정부 행태가 북한 사회에 널리 알려진 탓일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