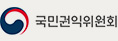[손기웅의 통일문] "대통령 신년사의 '비밀'...이 또한 북한 김정은에게 끌려다닌 세월" (최보식의 언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08회 작성일 23-01-18 14:34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대통령 신년사의 '비밀'...이 또한 북한 김정은에게 끌려다닌 세월" (최보식의 언론, 2023.01.09)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9211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시절 신년사를 1월 1일에 한 적이 없었다. 2018년 1월 10일, 2019년 1월 10일, 2020년 1월 7일, 2021년 1월 11일, 마지막으로 2022년에는 1월 3일 신년사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일 신년사를 했다. 대통령 신년사 날짜가 정상화 된 것이다. 덕담과 축원을 담은 간단한 인사가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 정책적 역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하지만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대북정책의 소신을 밝히지 않았던 점에서 역대 정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헌법 66조 3항에 명기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를 가슴에 안고, 한반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북핵 문제와 군사 도발에 어떠한 원칙과 전략으로 대응할지를 당당하게 말했어야 했다.
역대 정부나 대통령이 예외 없이 가졌던 ‘문제적 습관’이 있다. 북한 지도자가 매년 1월 1일 밝히는 신년사를 보고, 정부가 그 대응책을 다듬어 대통령 신년사 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정책을 공표해온 것이다.
대통령 신년사 작성을 위해 분야별로 국책연구기관들이 최소한 한 달 전에 ‘초안’ 작성에 돌입한다. 관련 분야를 또 세분화하여 담당 분야별로 전문 연구위원들이 ‘초초안’을 작성한다. 여기에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포함한다.
분야별 ‘초초안’이 만들어지면 해당 국책연구기관은 이를 종합하고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여기에 연구기관 지도부 의견이 마지막으로 반영되면 국정 한 분야의 ‘초안’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게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되면 초안은 다시 ‘초초안’이 된다. 부처는 자체적으로 마련된 안과 비교·검토하면서 수정·보완 작업에 들어간다. 국책연구기관의 초안이 직접 대통령실로 보고되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동시에 검토를 실시하는 경우도 많다.
한 정부 부처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대통령 신년사에 담길 해당 분야의 보고서는 다시 ‘초초안’이 되어 대통령실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이를 자체적 방침과 비교·검토하면서 마지막 ‘초안’ 작업에 들어간다. 여기에 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반영된다. 마침내 최종안이 마련되면 비서실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대통령실에 전달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친 신년사 내용, 즉 당해년도 분야별 평가와 차년도 국정 방향, 정책 근간이 12월 말에 분야별로 언론에 공개된다. 국내외 여론 반응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1월 1일 북한이 발표한, 지도자의 육성 신년사나 최근 김정은이 즐겨 쓰는 노동신문을 통한 당 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는 북한의 정책 방향, 대남정책이 대통령의 최종 신년사에 반영된다.
그러면 국책연구기관들이 이미 만든 보고서를 조정하고 이를 상위 정부부처들에 보고하고, 부처는 다시 이를 검토하여 대통령실에 보내 대통령 신년사에 담겨질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최종안이 결정되는 것이다.
과연 이 과정이 납득되고 불가피한 현실이어야 하는가. 국책연구기관들에 포진한 전문 인력, 학계와 부처의 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보고서가 북한 독재자 신년사에 따라 수정되고, 그것이 대통령 신년사에 반영되어 북한보다 늦게 대통령이 신년사를 하는 현실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 국력이 북한의 몇 배이고, 1인당 국민 소득이 몇 배인가. 미국 US뉴스앤월드리포트가 지난달 31일 ‘202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우선순위 6위로 발표한 대한민국이 묵과해야 할 현실인가.
우리 대통령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국정 전반의 한 부분으로 새해 대북정책의 방향, 남북관계 중점 방향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의 전문성이 만든 결정체가 먼저 국내에, 북한에, 세계에 알려져야 한다.
그것이 남북관계의 정상화다. 북한이,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이 밝히는, 신년사에 담길 대북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1월 1일을 숨죽이고 기다리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력에 걸맞게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우리의 정책 방향이 그들 정책 노선에 영향을 주고, 그들이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이어야 한다. 대통령과 동렬에 있지 않은, 최빈국을 만들고 최악의 독재로 통치하는 김정은의 처지여야 한다.
대통령이 먼저 육성으로 전하는 신년사에 담긴 대북정책이 김정은이 밝히는 대남정책과 충돌하거나 어긋날 수 있다. 우리의 국익이 북한과 다르고, 우리의 능력이 북한과 다르니 당연하다. 정책을 실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안하여 정책을 펼치면 되는 것이다.
당분간 남북 지도자가 1월 1일 경쟁적으로 신년사를 하고, 상호 정책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대통령이 국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에 부응하여 당당하게 먼저 밝혀야 한다. 어느 순간 북한 독재자가 대통령의 신년사, 대한민국의 무게를 절감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재임 시절에는 1월 1일 신년사를 해본 적 없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신년사를 했다. ‘퇴임 대통령의 신년사’라는 것도 엉뚱하다. 퇴임 후 잊히고 싶다는 그는 잊힐까 두려워 발버둥치는 것 같다. 현 정부는 비난하면서, 자신을 존경한다는 김정은에게 덕담과 축원을 건네지 않은 문재인, 그나마 다행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9211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시절 신년사를 1월 1일에 한 적이 없었다. 2018년 1월 10일, 2019년 1월 10일, 2020년 1월 7일, 2021년 1월 11일, 마지막으로 2022년에는 1월 3일 신년사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일 신년사를 했다. 대통령 신년사 날짜가 정상화 된 것이다. 덕담과 축원을 담은 간단한 인사가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 정책적 역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하지만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대북정책의 소신을 밝히지 않았던 점에서 역대 정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헌법 66조 3항에 명기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를 가슴에 안고, 한반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북핵 문제와 군사 도발에 어떠한 원칙과 전략으로 대응할지를 당당하게 말했어야 했다.
역대 정부나 대통령이 예외 없이 가졌던 ‘문제적 습관’이 있다. 북한 지도자가 매년 1월 1일 밝히는 신년사를 보고, 정부가 그 대응책을 다듬어 대통령 신년사 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정책을 공표해온 것이다.
대통령 신년사 작성을 위해 분야별로 국책연구기관들이 최소한 한 달 전에 ‘초안’ 작성에 돌입한다. 관련 분야를 또 세분화하여 담당 분야별로 전문 연구위원들이 ‘초초안’을 작성한다. 여기에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포함한다.
분야별 ‘초초안’이 만들어지면 해당 국책연구기관은 이를 종합하고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여기에 연구기관 지도부 의견이 마지막으로 반영되면 국정 한 분야의 ‘초안’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게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되면 초안은 다시 ‘초초안’이 된다. 부처는 자체적으로 마련된 안과 비교·검토하면서 수정·보완 작업에 들어간다. 국책연구기관의 초안이 직접 대통령실로 보고되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동시에 검토를 실시하는 경우도 많다.
한 정부 부처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대통령 신년사에 담길 해당 분야의 보고서는 다시 ‘초초안’이 되어 대통령실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이를 자체적 방침과 비교·검토하면서 마지막 ‘초안’ 작업에 들어간다. 여기에 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반영된다. 마침내 최종안이 마련되면 비서실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대통령실에 전달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친 신년사 내용, 즉 당해년도 분야별 평가와 차년도 국정 방향, 정책 근간이 12월 말에 분야별로 언론에 공개된다. 국내외 여론 반응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1월 1일 북한이 발표한, 지도자의 육성 신년사나 최근 김정은이 즐겨 쓰는 노동신문을 통한 당 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는 북한의 정책 방향, 대남정책이 대통령의 최종 신년사에 반영된다.
그러면 국책연구기관들이 이미 만든 보고서를 조정하고 이를 상위 정부부처들에 보고하고, 부처는 다시 이를 검토하여 대통령실에 보내 대통령 신년사에 담겨질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최종안이 결정되는 것이다.
과연 이 과정이 납득되고 불가피한 현실이어야 하는가. 국책연구기관들에 포진한 전문 인력, 학계와 부처의 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보고서가 북한 독재자 신년사에 따라 수정되고, 그것이 대통령 신년사에 반영되어 북한보다 늦게 대통령이 신년사를 하는 현실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 국력이 북한의 몇 배이고, 1인당 국민 소득이 몇 배인가. 미국 US뉴스앤월드리포트가 지난달 31일 ‘202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우선순위 6위로 발표한 대한민국이 묵과해야 할 현실인가.
우리 대통령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국정 전반의 한 부분으로 새해 대북정책의 방향, 남북관계 중점 방향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의 전문성이 만든 결정체가 먼저 국내에, 북한에, 세계에 알려져야 한다.
그것이 남북관계의 정상화다. 북한이,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이 밝히는, 신년사에 담길 대북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1월 1일을 숨죽이고 기다리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력에 걸맞게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우리의 정책 방향이 그들 정책 노선에 영향을 주고, 그들이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이어야 한다. 대통령과 동렬에 있지 않은, 최빈국을 만들고 최악의 독재로 통치하는 김정은의 처지여야 한다.
대통령이 먼저 육성으로 전하는 신년사에 담긴 대북정책이 김정은이 밝히는 대남정책과 충돌하거나 어긋날 수 있다. 우리의 국익이 북한과 다르고, 우리의 능력이 북한과 다르니 당연하다. 정책을 실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안하여 정책을 펼치면 되는 것이다.
당분간 남북 지도자가 1월 1일 경쟁적으로 신년사를 하고, 상호 정책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대통령이 국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에 부응하여 당당하게 먼저 밝혀야 한다. 어느 순간 북한 독재자가 대통령의 신년사, 대한민국의 무게를 절감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재임 시절에는 1월 1일 신년사를 해본 적 없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신년사를 했다. ‘퇴임 대통령의 신년사’라는 것도 엉뚱하다. 퇴임 후 잊히고 싶다는 그는 잊힐까 두려워 발버둥치는 것 같다. 현 정부는 비난하면서, 자신을 존경한다는 김정은에게 덕담과 축원을 건네지 않은 문재인, 그나마 다행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