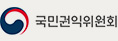[손기웅의 통일문] "동독 권력자 에리히 호네커는 어떻게 실각됐나...흥미진진한 막후스토리" (최보식의 언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88회 작성일 22-11-14 21:53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동독 권력자 에리히 호네커는 어떻게 실각됐나...흥미진진한 막후스토리" (최보식의 언론, 2022.11.07)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8575
<사진> 호네커 동독 당서기장
“에리히 더 이상은 안돼, 너는 떠나야만 해.”
18년 전 발터 울브리히트를 권좌에서 쫓아낼 때 했던 거의 같은 말을 1989년 10월 17일 동독 국가수반·공산당 당수·국방위원장 에리히 호네커 자신이 들어야 했다.
경제난 속에서도 개혁·개방을 거부하던 호네커에게 결정타를 날린 것이 5월의 부정선거였다. 여론과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 선거 결과에 동독 주민은 움직였다.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를 거쳐 서독으로 탈출했고, 동독 주요 도시마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자신의 시기가 지났음을 인정하지 않는 호네커를 몰아내기 위해 공산당 정치국원들의 공모·공작이 시작되었다. 비밀경찰 슈타지(Stasi)가 모든 정치국원을 감시하고 도청했기 때문에 비밀유지가 최대 관건이었다.
반란의 구심점은 호네커가 정치적으로 키운 황태자이자 권력 2인자 에곤 크렌츠여야 했다. 망설이는 그에게 9월 초 국가계획위원장이자 정치국원 게르하르트 쉬러가 호네커의 퇴진 외에 대안이 없다, 자신이 정치국회의에서 그것을 제안하고 자신 역시 모든 공직을 사임하겠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크렌츠는 호네커의 운명이 아니라 동독의 운명을 위해서라며 명분을 세웠다.
곧 동독지도부의 한적한 숲속 별장인 반트리츠에 해질 무렵 크렌츠, 정치국원이자 동베를린 공산당 제1서기 귄터 샤보프스키, 정치국원이자 노조연합위원장 해리 티쉬가 숨어들었다. 호네커는 물론이고 경제담당 귄터 밑탁, 선전선동담당 요아힘 헤르만도 함께 잘라야 한다는데 세 사람은 합의했다. 디데이는 10월 17일 화요일 정치국회의였다.
크렌츠는 추가 포섭에 나섰다. 총리로서 1970년 서독 빌리 브란트 수상과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가졌고, 당시 다시 총리를 맡고 있던 빌리 슈토프가 가담했다. 칼막스시 공산당 제1서기 지그프리드 로렌쯔, 공산당중앙위 보안담당 볼프강 헤르거에 이어 무엇보다 중요하고 결정적 대상인 슈타지 수장 에리히 밀케도 합류했다. 밀케는 독단적인 호네커로부터 정치국회의에서 중요한 집단적 토의와 결정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다수결 승리를 확신하자 이들은 소련 대사에도 거사계획을 알렸다. 고르바초프의 명확한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자 해리 티쉬는 10월 16일 월요일 급거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고르바초프가 “거사의 성공을 빈다(Ich wünsche dem Unternehmen viel Erfolg)”고 힘을 실어주었고, 호네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친위쿠데타 음모는 시작하기도 전에 위기에 처했다. 서독 대중지 ‘빌트(Bild)’가 1989년 10월 13일 금요일 “호네커, 수요일(10월 1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란 대문짝 특집을 ‘믿을만한 동베를린공산당 고위급에 따르면’이라 실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황당했던 기사’를 다행히 동독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 당시 서독 국가정보원(BND) 내부보고서보다 더 빠르고 정확했던 동 기사의 정보제공자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몇 달간 병마와 씨름하고 수술에서 겨우 회복한 77세 호네커는 권력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다고 확신했다. 불과 며칠 전 10월 7일 동독 건국 40주년 행사에서 받았던 인민군과 주민의 열렬한 환호를 아직도 음미하였다. 여느 화요일 정치국회의와 마찬가지로 1989년 10월 17일 회의실 문을 열었다, 다만 10여분 지각하여 가장 늦게 입장했다.
악수를 하며 모두에게 인사와 지연에 대해 사과를 한 그는 개회를 선언하고 제시된 의제에 관한 토의를 시작하고자 했다. 방울을 단 것은 오랜 동지이자 전우나 다름없었던 슈토프였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공산당 서기장의 해임 안건이 먼저 논의되기를 원한다며 의제 변경을 요청했다. 호네커의 얼굴이 단숨에 굳어졌다고 샤보프스키가 회고했다. 밀케가 비밀리에 슈타지 요원을 정치국 대기실에 배치한 상황이었다. 호네커와 그 추종자들이 반격할 경우 즉각 체포하기 위해서였다.
호네커는 충격적인 쿠데타의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가장하며 관례에 따라 안건에 대한 토론을 허용했다. 동조세력이 설마 있으랴는 그의 희망은 즉시 사라졌다. 정치국원, 동독 권부의 최고실세들이 순식간에 그로부터 멀어졌다.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밀케가 배반의 칼날을 휘둘렀다. 그는 상황이 매우 매우 심각하다, 우리도 정치국원으로서 공격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답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그냥 앉아 있는 동안 상황이 바뀌었다, 호네커는 설명을 찾지 말고 슈토프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많은 일을 겪었다, 그렇다고 탱크 발사를 시작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끝까지 자신의 실패,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호네커는 몸을 일으키며 마지막 숨을 내뱉었다. 여러분의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위기 속에서도 당은 ‘단결’을 유지해야 한다, 자신의 교체로 과연 동독 내부 문제가 진정될 것인가, 사람을 바꾸는 것은 ‘협박이 통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줄뿐이고 상대는 이를 이용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자신은 이 사실을 패배자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충직한 동료로서 말한다고 끝을 맺었다.
호네커는 자신의 퇴진 결정에 찬성한다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두 추종자 밑탁과 헤르만도 해임되었다. 정치국은 크렌츠를 공산당 서기장으로 추대했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공식적인 권력 교체는 다음날 이루어졌다. 호네커는 18일 개최된 공산당중앙위원회에 건강상의 이유로 자신의 사임을 요청했고, 불과 12분 후 국가기관지 ADN은 중앙위가 이를 수락했다고 보도했다.
호네커 18년 권좌가 무너졌다. 그럼에도 마지막 그의 예언만큼은 적중했다. 동독 주민은 더 많은 것을 원했고, 그의 퇴장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11월 9일 베를린장벽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고, 다음해 10월 3일 동독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만 했다. 크렌츠, 샤보프스키, 티쉬, 슈토프, 밀케 등 모두가 통일 이후 반인권·비인도적 행위로 법정에 서야 했으나, 처형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1월 9일, 베를린장벽 붕괴 33주년이다. 핵무기가 없었던 때도 없었던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핵무력을 완성하고서도 있다 하고, 오로지 권력 유지를 위해 최악의 독재로 자유와 인권은 언감생신(焉敢生心)이고 배마저 곯리는 김정은, 김씨 일가다.
북한 주민, 정치국원, 당중앙위원 여러분,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까?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8575
<사진> 호네커 동독 당서기장
“에리히 더 이상은 안돼, 너는 떠나야만 해.”
18년 전 발터 울브리히트를 권좌에서 쫓아낼 때 했던 거의 같은 말을 1989년 10월 17일 동독 국가수반·공산당 당수·국방위원장 에리히 호네커 자신이 들어야 했다.
경제난 속에서도 개혁·개방을 거부하던 호네커에게 결정타를 날린 것이 5월의 부정선거였다. 여론과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 선거 결과에 동독 주민은 움직였다.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를 거쳐 서독으로 탈출했고, 동독 주요 도시마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자신의 시기가 지났음을 인정하지 않는 호네커를 몰아내기 위해 공산당 정치국원들의 공모·공작이 시작되었다. 비밀경찰 슈타지(Stasi)가 모든 정치국원을 감시하고 도청했기 때문에 비밀유지가 최대 관건이었다.
반란의 구심점은 호네커가 정치적으로 키운 황태자이자 권력 2인자 에곤 크렌츠여야 했다. 망설이는 그에게 9월 초 국가계획위원장이자 정치국원 게르하르트 쉬러가 호네커의 퇴진 외에 대안이 없다, 자신이 정치국회의에서 그것을 제안하고 자신 역시 모든 공직을 사임하겠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크렌츠는 호네커의 운명이 아니라 동독의 운명을 위해서라며 명분을 세웠다.
곧 동독지도부의 한적한 숲속 별장인 반트리츠에 해질 무렵 크렌츠, 정치국원이자 동베를린 공산당 제1서기 귄터 샤보프스키, 정치국원이자 노조연합위원장 해리 티쉬가 숨어들었다. 호네커는 물론이고 경제담당 귄터 밑탁, 선전선동담당 요아힘 헤르만도 함께 잘라야 한다는데 세 사람은 합의했다. 디데이는 10월 17일 화요일 정치국회의였다.
크렌츠는 추가 포섭에 나섰다. 총리로서 1970년 서독 빌리 브란트 수상과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가졌고, 당시 다시 총리를 맡고 있던 빌리 슈토프가 가담했다. 칼막스시 공산당 제1서기 지그프리드 로렌쯔, 공산당중앙위 보안담당 볼프강 헤르거에 이어 무엇보다 중요하고 결정적 대상인 슈타지 수장 에리히 밀케도 합류했다. 밀케는 독단적인 호네커로부터 정치국회의에서 중요한 집단적 토의와 결정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다수결 승리를 확신하자 이들은 소련 대사에도 거사계획을 알렸다. 고르바초프의 명확한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자 해리 티쉬는 10월 16일 월요일 급거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고르바초프가 “거사의 성공을 빈다(Ich wünsche dem Unternehmen viel Erfolg)”고 힘을 실어주었고, 호네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친위쿠데타 음모는 시작하기도 전에 위기에 처했다. 서독 대중지 ‘빌트(Bild)’가 1989년 10월 13일 금요일 “호네커, 수요일(10월 1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란 대문짝 특집을 ‘믿을만한 동베를린공산당 고위급에 따르면’이라 실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황당했던 기사’를 다행히 동독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 당시 서독 국가정보원(BND) 내부보고서보다 더 빠르고 정확했던 동 기사의 정보제공자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몇 달간 병마와 씨름하고 수술에서 겨우 회복한 77세 호네커는 권력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다고 확신했다. 불과 며칠 전 10월 7일 동독 건국 40주년 행사에서 받았던 인민군과 주민의 열렬한 환호를 아직도 음미하였다. 여느 화요일 정치국회의와 마찬가지로 1989년 10월 17일 회의실 문을 열었다, 다만 10여분 지각하여 가장 늦게 입장했다.
악수를 하며 모두에게 인사와 지연에 대해 사과를 한 그는 개회를 선언하고 제시된 의제에 관한 토의를 시작하고자 했다. 방울을 단 것은 오랜 동지이자 전우나 다름없었던 슈토프였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공산당 서기장의 해임 안건이 먼저 논의되기를 원한다며 의제 변경을 요청했다. 호네커의 얼굴이 단숨에 굳어졌다고 샤보프스키가 회고했다. 밀케가 비밀리에 슈타지 요원을 정치국 대기실에 배치한 상황이었다. 호네커와 그 추종자들이 반격할 경우 즉각 체포하기 위해서였다.
호네커는 충격적인 쿠데타의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가장하며 관례에 따라 안건에 대한 토론을 허용했다. 동조세력이 설마 있으랴는 그의 희망은 즉시 사라졌다. 정치국원, 동독 권부의 최고실세들이 순식간에 그로부터 멀어졌다.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밀케가 배반의 칼날을 휘둘렀다. 그는 상황이 매우 매우 심각하다, 우리도 정치국원으로서 공격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답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그냥 앉아 있는 동안 상황이 바뀌었다, 호네커는 설명을 찾지 말고 슈토프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많은 일을 겪었다, 그렇다고 탱크 발사를 시작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끝까지 자신의 실패,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호네커는 몸을 일으키며 마지막 숨을 내뱉었다. 여러분의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위기 속에서도 당은 ‘단결’을 유지해야 한다, 자신의 교체로 과연 동독 내부 문제가 진정될 것인가, 사람을 바꾸는 것은 ‘협박이 통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줄뿐이고 상대는 이를 이용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자신은 이 사실을 패배자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충직한 동료로서 말한다고 끝을 맺었다.
호네커는 자신의 퇴진 결정에 찬성한다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두 추종자 밑탁과 헤르만도 해임되었다. 정치국은 크렌츠를 공산당 서기장으로 추대했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공식적인 권력 교체는 다음날 이루어졌다. 호네커는 18일 개최된 공산당중앙위원회에 건강상의 이유로 자신의 사임을 요청했고, 불과 12분 후 국가기관지 ADN은 중앙위가 이를 수락했다고 보도했다.
호네커 18년 권좌가 무너졌다. 그럼에도 마지막 그의 예언만큼은 적중했다. 동독 주민은 더 많은 것을 원했고, 그의 퇴장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11월 9일 베를린장벽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고, 다음해 10월 3일 동독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만 했다. 크렌츠, 샤보프스키, 티쉬, 슈토프, 밀케 등 모두가 통일 이후 반인권·비인도적 행위로 법정에 서야 했으나, 처형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1월 9일, 베를린장벽 붕괴 33주년이다. 핵무기가 없었던 때도 없었던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핵무력을 완성하고서도 있다 하고, 오로지 권력 유지를 위해 최악의 독재로 자유와 인권은 언감생신(焉敢生心)이고 배마저 곯리는 김정은, 김씨 일가다.
북한 주민, 정치국원, 당중앙위원 여러분,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